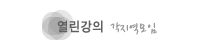주관은 객관을 따라 소멸하고 객관은 주관을 따라 사라진다 ㅡ 신심명 9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태 댓글 0건 조회 6,498회 작성일 13-10-05 09:30본문
지난 94년 4월 제가 50일 단식을 하기 위해 상주에 있는 자그마한 암자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땐 ‘영혼의 자유’를 찾아 떠돌아다니던 저의 오랜 방황과 목마름이 극에 달해 있을 때였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었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온 터라,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 종일 암자에 틀어박혀 앉아 오직 내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내면에서 떠오르는 감정, 느낌, 생각들을 단지 바라보기만 하는 ‘관법(觀法)’이라는 수행법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앉아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내면을 지켜보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모든 것이 확연해지는 깨달음이 찾아오리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그렇게 ‘단지 바라보기만 하는’ 수행법을 행하게 된 데에는 91년 초 제가 지리산 토굴에 있을 때의 한 체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는 하루 두 끼에 소식(小食)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밥을 먹고 그릇을 씻기 위해 토굴을 나서다가 갑자기 ‘이 몸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갑작스런 앎’ 이후로 제게는 저절로 관법이 되었고, 그러면서 많은 부분 삶이 가벼워지긴 했지만, 그러나 닿을 듯 닿을 듯 닿지 않는 ‘궁극에의 목마름’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서, 마침내 모든 외적인 움직임을 멈추고 오직 내면을 관하기 위해 50일 단식을 결행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마음과는 달리 저는 하루 종일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망상과 잡생각에 시달리며 몹시도 괴로워했습니다. 단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단 한 순간도 제대로 지켜보지 못한 채 늘 놓치고만 있는, 그래서 늘 망상과 잡생각에 휘둘리기만 하는 자신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아, 그것은 얼마나 큰 절망감을 제게 가져다줬는지 모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처자식마저 버려두고 떠나온 자리에서 한 발짝도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매 순간 목격한다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망상덩어리였습니다…….
그때의 저의 내면은 ‘지켜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으로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원(二元)의 분별 속에서 ‘지켜보는 자’가 ‘보이는 대상’ 곧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온갖 망상과 잡생각과 감정과 느낌들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다 보면 그 극점에서 마침내 나의 오랜 목마름을 영원히 끝낼 ‘궁극의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결론은 정반대로 나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제 안에서 ‘지켜보는 자’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곤 ‘보이는 대상’만 남았는데, 그러고 나니 희한하게도 그것이 ‘대상’이라고도, 망상이라고도, 잡생각이라고도, 번뇌라고도 생각되지 않고 그냥 다만 있는 그대로일 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지켜보는 자’가 사라지는 동시에 ‘보이는 대상’도 함께 사라져버린 것인데, 그 순간 제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와 이완이 가득히 흘렀습니다. 마침내 생의 모든 방황과 목마름에 종지부가 찍히는 순간이었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무언가를 해야 했고 또 찾아 다녀야만 했는데, 찾고 구하는 그 마음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고,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생활의 어떤 자리 어느 순간에서도 허무하거나 헛되지가 않았으며, 인생의 모든 의문이 풀렸고, 무거웠던 마음의 모든 짐들이 남김없이 내려졌습니다. 힘들었던 모든 인간관계가 편안해졌으며. 한 여름 타들어가는 들판처럼 메말랐던 가슴에 충만과 감사와 사랑이 솟구쳐 오르면서 남들과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안’을 둘로 나누어 놓았던 분별이 사라지면서 ‘밖’ 또한 있는 그대로 보게 되어, 안과 밖이 하나인 세계의 실상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승찬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
能隨境滅 境逐能沈
능수경멸 경축능침
주관은 객관을 따라 소멸하고, 객관은 주관을 따라 사라진다.
‘지켜보는 자’가 사라지고 ‘보이는 대상’만 남으니 ‘대상’이랄 것도 없이 다만 있는 그대로일 뿐이었듯이, 그렇게 주관과 객관이 소멸하고 사라진 자리에서는 ‘나’와 ‘너’라는 구별도, 중생과 부처라는 분별도, 생멸법(生滅法)과 불법(佛法)이라는 이법(二法)도 모두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다만 있는 그대로일 뿐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27.
境由能境 能由境能
경유능경 능유경능
객관은 주관으로 말미암아 객관이요, 주관은 객관으로 말미암아 주관이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다가 물을 마시려고 문득 컵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큰 것입니까, 작은 것입니까?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닌, 다만 있는 그대로의 것일 뿐이지요. 그런데 국그릇을 들고 그 옆에 나란히 놓으면 컵은 대번에 ‘작은’ 것이 됩니다. 또 자그마한 간장 종지를 그 옆에 두면 컵은 이번엔 ‘큰’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컵은 큰 것입니까, 작은 것입니까?
간장 종지라는 작은 인연을 만나면 컵은 ‘크다’가 되지만, 국그릇이라는 큰 인연을 만나면 이번엔 ‘작다’가 됩니다. 그와 같이 ‘크다’, ‘작다’라는 것은 다만 인연 따라 잠시 생겼다가 사라질 뿐인, 실체가 없는 것이지요. 노자도 도덕경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已. 皆知善之爲善, 斯不善已.
천하개지미지위미, 사악이. 개지선지위선, 사불선이.
故有無相生, 難易相成, 長短相形, 高下相傾, 音聲相和, 前後相隨.
고유무상생, 난이상성, 장단상형, 고하상경, 음성상화, 전후상수.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이라고 알지만, 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선(善)을 선이라고 알지만, 이는 선이 아니다. 그러므로 ‘있다’고 하기에 ‘없다’는 것이 생기고, ‘어렵다’고 하기에 ‘쉽다’는 것이 이루어지며, ‘길다’고 하기에 ‘짧다’는 상대도 만들어진다. 높고 낮음도 서로 가능하게 해주고, 음과 소리는 서로 어울리며, ‘앞’이라고 하기에 ‘뒤’라는 것도 있게 된다.
‘객관’이라고 하기에 ‘주관’이라는 것이 생기고 ‘주관’이라고 하기에 ‘객관’이라는 것도 있게 되지만 사실은 그렇게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실체가 없는 것이지요.
28.
欲知兩段 元是一空
욕지양단 원시일공
양 끝을 알고자 하는가? 원래 하나의 공(空)이다.
예, 원래 하나의 공(空)일 뿐입니다. 공이란, 다른 말로 하면 ‘있는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제가 문득 든 컵과도 같이 지금 이대로의 모든 것은 크다-작다, 많다-적다, 높다-낮다, 좋다-나쁘다, 아름답다-추하다, 앞섰다-뒤처졌다, 잘났다-못났다 라는 비교와 분별과 판단 이전의 다만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체개공(一切皆空, 일체 모든 것은 다 공하다)이라고도 하지요. 세계의 실상은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하나요 전체일 뿐인 것을, 이원성(二元性)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세계를 둘로 분리된 것으로 볼 뿐이랍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눈앞을 가리고 있는 그 한 마음만 내려지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영원하고 무한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답니다.
29.
一空同兩 齊含萬象
일공동양 제함만상
하나의 공이 두 끝과 같으니, 삼라만상을 다 머금는다.
그렇게 일체가 모두 공할 뿐임을 알게 되면 ‘이원(二元)’이라는 것도 영원히 사라지면서, 언제나 그 허구의 세계 속에서 이리저리 끄달려 다니며 괴로워하던 마음의 모든 고통과 목마름도 끝이 납니다. 말하자면, 단 한 순간도 떠난 적이 없는 하나요 전체인 본래자리로 비로소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 보면 그 자리는 다시 온갖 상대성 속에서 생멸을 거듭하는 이원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알게 되지요, 하나가 곧 둘이요 둘이 곧 하나라는 것을. 육조단경(六祖壇經)에서 불리불염(不離不染)이라고 말한 혜능대사의 말처럼, ‘둘’을 떠나 있지 않지만 ‘둘’에 물들지도 않고 ‘하나’를 떠나지 않지만 ‘하나’에 매이지도 않는다는 것을……. 삶의 모든 순간에 마침내 자유가 온 것입니다.
30.
不見精麤 寧有偏黨
불견정추 영유편당
세밀함과 거칢을 나누어 보지 않는다면 어찌 치우침이 있겠는가.
세밀함도 공이요 거칢도 공인 줄을 알면 거기 어디에 치우침이 있겠습니까. 사랑과 미움, 성실과 게으름, 기쁨과 슬픔, 충만과 초라함, 얻음과 잃음, 잘남과 못남, 아름다움과 추함, 생(生)과 사(死) 그 모두가 다만 공할 뿐임을 알면 거기 어디에 하나는 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리려고 하는 집착과 어리석음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삶의 ‘파도’들이 거칠게 혹은 잔잔하게, 따뜻하게 혹은 차갑게, 조금씩 또는 한꺼번에 몰려온다 한들 그 모두가 다만 ‘바다’일 뿐인 것을요.
31.
大道體寬 無易無難
대도체관 무이무난
대도는 바탕이 드넓어서 쉬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
모두가 도 아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도(大道)’라고 하고, ‘바탕이 드넓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조 스님도 “삼라급만상일법지소인(森羅及萬象一法之所印, 삼라만상은 하나의 법(法)이 찍어내는 것이다.)”이라고 하셨듯이, 아프고, 슬프고, 기분 좋고, 우울하고, 심심하고, 기쁘고, 쩔쩔 매고, 잡생각이 일어나고, 상쾌하고, 강박에 시달리고, 등이 가렵고, 꿈을 꾸고,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지고, 별이 빛나고, 계절이 바뀌고, 빗소리가 들리고, 귀뚜라미가 울고 하는 등의 모두가 도 아님이 없습니다. 거기 어디에 쉽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이대로 이미 대도(大道) 안에 있습니다. 대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