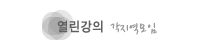마음의 판(板) ㅡ 신심명 13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태 댓글 0건 조회 5,637회 작성일 14-01-31 18:02본문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책상 위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물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17년 동안 계속 해오던 전국의 모든 강의를 잠시 접으며 《종교 밖으로 나온 성경》이라는 책을 집필한다고 했더니 어느 고마운 분이 선뜻 보내 주셔서 잘 쓰고 있는 노트북이 내 앞에 있고, 그 옆으로 국어사전과 성경책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노트북 곁에는 스탠드가 다정스럽게 서서 이 자판을 환하게 비추어주고 있으며, 프린트기도 그 옆에 한 자리를 떡 하니 차지하고 있습니다. 책상 왼쪽으로는 책이 몇 권 꽂혀 있고, 대나무 통으로 된 볼펜꽂이며 메모지, 손목시계, 휴대폰, 몇 장의 인쇄물 등이 나름의 질서를 유지하며 누워있거나 앉아 있습니다. 또 오른쪽으로는 여행용 화장지와 빨간 볼펜 한 자루, 몇 개의 USB를 담아서 보관하는 자그마한 명함통, 그리고 조금 전 입술에 발랐던 연초록의 립밤이 수줍은 듯 서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책상 위에 올라와 있지만, 그러나 오후에 제가 도서관에 가서 작업하려고 일어서면서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국어사전과 성경책도 챙기고 손목시계도 차고 휴대폰을 집으며 책을 책꽂이에 꽂고 여행용 화장지와 립밤을 호주머니에 넣고 스탠드 불도 끄게 되면 책상 위에는 다시 아무 것도 남지 않고 휑한 어둠만이 올려져 있겠지요.
또 어느 날에는 제가 집필과 요리를 함께 하다 보면 요리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항상 글 생각뿐이고 그래서 자주 책상에 돌아와서 앉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책상 위에는 때로는 시퍼런 식칼이 올라오기도 하고 물 젖은 고무장갑이랑 행주뿐만 아니라 썰면서 묻혀 온 몇 개의 매운 청량고추 씨랑 파 부스러기도 조금 올라오기도 하고, 설거지할 땐 주방세제의 거품도 몇 방울 책상 위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윽고 식사를 다하고 나면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들고 책상 앞에 앉아 다음 문장을 어떻게 이어갈까 생각하며 홀린 듯 모니터를 바라보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만 커피를 책상 위에 엎지르기도 합니다. 또 여기까지 쓰다가 방금 전에는 사과를 하나 먹고 싶어서 냉장고에서 꺼내어 과도와 함께 접시에 담아 와서 깎아 먹고 있는데, 책상 위에는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예측할 수 없는 이런저런 물건들이 올려졌다가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져 텅 비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오고 감에 대해서 책상은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무엇이 올라오건 무엇이 사라지건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지요. 자신 위에 올려지는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 어떤 것은 좋다 하며 잡아두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것은 싫다 하며 거부하거나 밀어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문득 중국 오대(五代) 때의 승려인 용아화상(龍牙和尙)이 쓴 선시(禪詩)가 생각납니다.
深念門前樹 能令鳥泊棲
심념문전수 능령조박서
來者無心喚 去者不慕歸
래자무심환 거자불모귀
若人心似樹 與道不相違
약인심사수 여도불상위
문 앞에 서있는 한 그루 나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노라.
선선히 새들에게 그 둥지를 내어주고
오는 자 무심(無心)히 맞아주며
가는 자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는구나.
만약 사람의 마음이 이 나무와 같다면
도(道)와 더불어 어긋나지 않으리.
우리 마음 안에도 이 책상과 같은 ‘판(板)’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저런 삶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온갖 감정, 느낌, 생각들이 이 ‘마음의 판’ 위에 올려지거나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다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순간을 경험할 뿐 어떤 것은 좋다 하며 집착하거나 어떤 것은 싫다 하며 버리려고 하지 않는 ‘무분별(無分別) 혹은 무간택(無揀擇)의 판’ 같은 것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 ‘판’이 있지만, 그러나 이 ‘판’은 마치 감추어져 있는 듯 사람들에게 잘 발견되지도 않고 묻혀 있는 듯 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 ‘판’을 자신 안에 엄연히 갖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채 그저 그 ‘판’ 위에 올라오는 온갖 감정, 느낌, 생각들을 끊임없이 가리고 택하느라 분주하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고통과 괴로움을 불러들이지요.
만약 우리가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책상과 같은 마음이 되어 우리 ‘내면의 판’ 위에 무엇이 올라오건 무엇이 사라지건 다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용아화상이 선시에서 노래한 나무처럼 어떤 것이 우리 안에서 찾아오든 막지 않고 어떤 것이 사라져 가든 잡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도(道)요 깨달음이며 자유입니다.
49.
一如體玄 兀爾忘緣
일여체현 올이망연
한결같은 바탕은 현묘하니, 그윽이 차별 인연을 잊는다.
사실 책상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올라오건 그건 그냥 물건일 뿐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책상은 무정물(無情物)이지만, 우리 마음은 매 순간 생생하게 살아 있으면서도 책상과 같은, 나무와 같은 무분별과 무간택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경험하지만 그 어느 것에도 물들거나 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이 일상의 삶 속에서 낱낱이 맛보며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본래 있는 그 ‘판’이 발견되거나 깨어나기만 하면 말입니다.
사실 저도 그 ‘판’을 알게 되기 전에는 제 안에서 올라오는 온갖 것들을 좋다-나쁘다, 됐다-안 됐다, 잘났다-못났다, 완전하다-부족하다, 앞이다-뒤다 하고 끊임없이 분별하며 가리고 택하느라 언제나 힘이 들고 괴로웠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며 좋은 것, 잘난 것, 완전한 것, 앞선 것만을 내것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었고,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을 하며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 못난 것, 부족하고 초라한 것, 뒤처진 것, 볼품없는 내 안의 많은 ‘나’들을 버리려고 해도 안 되었습니다. 아, 그 수고와 고통과 괴로움은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문득 그 모든 애씀들이 내려지고 내 안의 그 ‘판’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모든 차별 인연을 잊고 고요해졌으며, 삶의 모든 순간을 생생하게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하나 또렷이 경험하면서도 그 어디에도 함몰되지 않는 완전하고도 한결같은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悟了還同未悟人(오료환동미오인, 깨닫고 나니 도리어 깨닫지 못한 사람과 같구나.)이라는 말처럼, 삶의 희로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欲)을 경험하는 것은 이전과 똑같으나 그 어느 것에도 물들지 않으니, 이 한결같은 바탕은 참으로 현묘하기가 그지없습니다.
50.
萬法齊觀 歸復自然
만법제관 귀복자연
만법을 평등하게 보면 본래 그러함으로 돌아간다.
만법을 평등하게 보면 즉,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본래 그러함[自然]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안의 모든 것들은 이미 처음부터 본래 그러했을 뿐입니다. 슬픔이 나쁜 것도 아니고 버려야 할 것도 아니며 단지 슬픔일 뿐이듯이, 기쁨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항상 내 곁에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닌 단지 그 순간 경험하게 되는 기쁨일 뿐이듯이, 충만은 충만이요 초라함은 초라함일 뿐 그 둘 가운데 어떤 것은 택하고 어떤 것은 버려야 할 아무런 까닭이 없듯이, 불안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내 마음’이요 편안함과 당당함도 어느 순간 내 안에서 경험하는 ‘내 마음’일 뿐이어서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그렇게 만법을 평등하게 보게 되면 내 안에서 순간순간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生)-멸(滅)일 뿐 아무 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생멸법(生滅法)이 곧 불법(佛法)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51.
泯其所以 不可方比
민기소이 불가방비
그 까닭을 없애 버리면 견주어 비교할 수 없다.
‘까닭’이란 본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까닭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항상적인 ‘지금’ 속에 존재해 보면 모든 것은 본래 그러할 뿐[自然] 까닭도 없고 견주어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비로소 자신의 전부를 통째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면의 모든 분열이 끝난 지극한 평화 속에서 모든 것을 긍정하며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며 삶을 즐겁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52.
止動無動 動止無止
지동무동 동지무지
그침에서 움직이니 움직임이 따로 없고, 움직임에서 그치니 그침이 따로 없다.
삶의 실상은 ‘흐름’입니다. 모든 것은 다만 흐를 뿐 멈추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쁨은 다시 슬픔이 되고, 얻음은 다시 잃음이 되며, 쌓음은 다시 무너짐이 되고, 오르막은 다시 내리막이 되며, 움직임은 다시 그침이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그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남기고 다른 하나는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언제나 흘러오는 ‘둘’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라는 깨달음이 주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지복(至福)을 항상 맛보며 누릴 수 있습니다.
53.
兩旣不成 一何有爾
양기불성 일하유이
둘이 이미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하나가 어찌 이루어지겠는가?
사실은 하나이기에 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임을 알고 나면 ‘하나’라는 것도 사라집니다. 그리하여 삶은 다만 온갖 다양한 것들이 흘러와서 나를 풍요롭게 하고 깊어지게 하며 끝없이 성장케 하는 감사한 것들로 가득할 뿐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