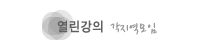신심명(信心銘) 강의 ― (3)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태 댓글 0건 조회 8,495회 작성일 06-02-07 08:14본문
신심명(信心銘) 강의 ― (3)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승찬(僧璨) 스님이 들려주시는 신심명(信心銘)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한 번 밝혀 보십시다. 사실, 마음 밝히기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밝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밝아 있기에, 따로이 밝힐 것이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마음을 밝히기 위해 해야할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승찬(僧璨) 스님이 들려주시는 신심명(信心銘)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한 번 밝혀 보십시다. 사실, 마음 밝히기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밝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밝아 있기에, 따로이 밝힐 것이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마음을 밝히기 위해 해야할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우리 자신이 이미 우리 자신으로부터 해방(解放)되어 있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유롭게 되기란 따 놓은 당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힘든 일이겠지만, 이미 다 가지고 있기에, 가진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은 따 놓은 당상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뿐인데, 제대로 그것을 알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존재의 비약(飛躍)'이 오는 것이지요.
<돈오입도요문론(頓悟入道要門論)>이라는 책을 쓴 대주 혜해(大珠慧海) 스님에 관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스님이 어느 날 마조(馬祖) 스님을 찾아가는데, 찾아온 그를 보자 마조스님이 대뜸 묻습니다.
"어디서 왔는고?"
"월주(越州) 대운사(大雲寺)에서 왔습니다."
"무엇 하러 왔는고?"
"불법(佛法)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마조스님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꾸짖듯 말합니다.
"자기 집의 보배창고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집을 떠나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구하는가? 나에게는 한 물건도 없는데, 어떤 불법(佛法)을 구하려 하는가?"
이 말을 들은 혜해스님은 깜짝 놀라며 묻습니다.
"무엇이 저의 보배창고 입니까?"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것이 바로 너의 보배창고이니라. 일체가 구족(具足)하여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사용이 자재(自在)한데, 어찌하여 밖에서 구하려 하는가?"
이 말 끝에 혜해스님은 문득 깨칩니다. 말하자면, 그 순간 '불법(佛法)'이라는 것을 따로이 두던 관념과 상(相) ― 분별심(分別心) ― 이 떨어져나간 것이지요. 그리곤 뛸 듯이 기뻐하며 마조스님에게 큰절을 올립니다.
<돈오입도요문론(頓悟入道要門論)>이라는 책을 쓴 대주 혜해(大珠慧海) 스님에 관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스님이 어느 날 마조(馬祖) 스님을 찾아가는데, 찾아온 그를 보자 마조스님이 대뜸 묻습니다.
"어디서 왔는고?"
"월주(越州) 대운사(大雲寺)에서 왔습니다."
"무엇 하러 왔는고?"
"불법(佛法)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마조스님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꾸짖듯 말합니다.
"자기 집의 보배창고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집을 떠나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구하는가? 나에게는 한 물건도 없는데, 어떤 불법(佛法)을 구하려 하는가?"
이 말을 들은 혜해스님은 깜짝 놀라며 묻습니다.
"무엇이 저의 보배창고 입니까?"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것이 바로 너의 보배창고이니라. 일체가 구족(具足)하여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사용이 자재(自在)한데, 어찌하여 밖에서 구하려 하는가?"
이 말 끝에 혜해스님은 문득 깨칩니다. 말하자면, 그 순간 '불법(佛法)'이라는 것을 따로이 두던 관념과 상(相) ― 분별심(分別心) ― 이 떨어져나간 것이지요. 그리곤 뛸 듯이 기뻐하며 마조스님에게 큰절을 올립니다.
이 이야기가 참 재미있는 것은, 조금 전까지 불법(佛法)을 구하던 그가 바로 다음 순간 모든 갈구(渴求)가 끝이 난 자리에 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불법(佛法)'이니 '보배창고'니 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을 스스로가 따로이 만들어놓고 그것을 구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은 지금껏 허상(虛像)을 좇고 있었다는 것을 문득 알게된 것이구요. 우리 마음 밝히기도 이와 똑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심명(信心銘) 6번까지를 읽었습니다. 읽기는 거기까지 읽어놓고 설명은 1번과 2번만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번부터 하겠습니다. 한 번 읽어보지요.
3. 毫釐有差 天地懸隔 (호리유차 천지현격)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만큼 벌어지나니,
정말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과 '그 자체가 되는 것'과의 사이는 얼핏 보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늘과 땅만큼의 거리가 있어요. 전자(前者)는, 깊이 들여다보면, 끊임없는 긴장과 내적 구속을 동반하지만, 후자(後者)는 무애(無碍)에서 비롯되는 무한한 자유와 질서가 있어요. 그것은 말하자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전자는 살았으나 죽었고, 후자는 살아서 이미 영원한 참 생명의 풍요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4. 欲得現前 莫存順逆 (욕득현전 막존순역)
도(道)가 앞에 나타나기를 바라거든, 따름과 거슬림을 두지 말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게으름'에 대해서 어느 교수님의 경우를 예로 들어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불안'과 관련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러고 보니, 벌써 두 해 전의 일이네요. 어느 날 대구에 계신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인터넷을 통해 제게 연락이 와서는 한 번 저를 만나고 싶다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곤 대뜸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면 불안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좀 더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자신은 삶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경우에도 진정 자신답지 않고 무언가 항상 떠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신심명(信心銘) 6번까지를 읽었습니다. 읽기는 거기까지 읽어놓고 설명은 1번과 2번만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번부터 하겠습니다. 한 번 읽어보지요.
3. 毫釐有差 天地懸隔 (호리유차 천지현격)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만큼 벌어지나니,
정말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과 '그 자체가 되는 것'과의 사이는 얼핏 보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늘과 땅만큼의 거리가 있어요. 전자(前者)는, 깊이 들여다보면, 끊임없는 긴장과 내적 구속을 동반하지만, 후자(後者)는 무애(無碍)에서 비롯되는 무한한 자유와 질서가 있어요. 그것은 말하자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전자는 살았으나 죽었고, 후자는 살아서 이미 영원한 참 생명의 풍요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4. 欲得現前 莫存順逆 (욕득현전 막존순역)
도(道)가 앞에 나타나기를 바라거든, 따름과 거슬림을 두지 말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게으름'에 대해서 어느 교수님의 경우를 예로 들어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불안'과 관련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러고 보니, 벌써 두 해 전의 일이네요. 어느 날 대구에 계신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인터넷을 통해 제게 연락이 와서는 한 번 저를 만나고 싶다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곤 대뜸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면 불안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좀 더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자신은 삶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경우에도 진정 자신답지 않고 무언가 항상 떠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한 사람의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대할 때에도 자신은 진정 교사다운 모습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지, 또한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것저것 애써보지만 이게 과연 아버지답다 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남편으로서, 가장(家長)으로서, 자식으로서의 끊임없이 주어지는 역할에 있어서도 자신은 언제나 아직 아닌 듯 하고 턱없이 부족한 듯 하여 그때마다 늘상 입술이 타듯 한 심정이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야말로 이젠 하루 하루가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그분은 '불안'이라고 표현했던 것인데, 단 한 순간만이라도 불안하지 않고, 자신답고 당당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다시는 불안하지 않고 당당하게, 또한 언제나 자신답고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진정 그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진정 불안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다면, 불안하지 않고 당당한 사람이 되려는 그 마음을 버리고 그냥 그 불안 속에 있으십시오. 그냥 불안하라는 말이지요. 불안을 떨쳐버리고 당당한 사람이 되려는 일체의 노력과 마음들을 정지하고, 그냥 지금 선생님에게 찾아온 그 불안을 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진실로 단 한 순간만이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다시는 선생님의 삶 속에서 '불안'이라는 것을 목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욕득현전(欲得現前)이어든 막존순역(莫存順逆)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몹시 의아해 하며, "아니, 이 불안하고, 언제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안절부절못하는 이 마음을 견딜 수 없어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싶어서, 정말이지 타는 듯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냥 불안하라니오? 더구나 불안을 벗어나려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니오! 그냥 그 불안 속에 있으라니오! 그럼, 저보고 죽으라는 말입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런 말에 무어라 딱 꼬집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 같은 것을 느끼셨던 모양입니다. 그것은 아마 그분 자신이 그동안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자각과 함께 어떤 절망감 같은 것이 내면 깊이 이미 와있었기 때문에 저의 그런 말들이 가슴으로 들려왔던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곤 마치 무언가에 한 방 얻어맞은 듯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후 오래지 않아 그분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말하자면, '갈증'과 '추구'의 옛 사람은 죽고, 자유롭고 행복하며 진실로 감사할 줄 아는 새 사람이 된 것인데, 아아, 그분이 대구 도덕경 모임에 나오셔서 들려주고 보여주신 '변화된 삶'의 얘기들은 얼마나 주옥같고 눈부시던지요!
'그 이전(以前)'에는 하루 하루가 지겹고, 그래서 산다는 것 자체가 한없이 힘겨웠으며, 더욱이 어느 날엔가는 문득 터럭만큼의 변화도 없는 자신의 매일 매일의 일과(日課) ―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똑같고, 일어나서 용변보고 세수하고 밥먹고 하는 순서와 소요시간이 똑같으며, 출근길이 똑같고, 만나는 아이들이 똑같고, 해야 할 일들이 똑같고, 퇴근시간과 그 이후의 일들마저 똑같은데, 아아 그 똑같은 일들을 내일도, 모레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야 한다는 ― 를 자각하고는 숨마저 막혀오는 고통으로 괴로워했었는데, '그 이후(以後)'에는 매일 매일의 삶은 전과 다름없이 똑같건만, 희한하게도 그 똑같은 일상(日常) 속에서 전혀 새롭고도 신명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먹고 출근할 때까지의 시간과 순서와 가는 길은 똑같은데, 이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푹 내쉬며, '또 가야 하나……? 이 긴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내야 하나……?'라고 했다면, 이후에는 '아, 또 하루가 시작되누나! 내가 이렇게 잠을 자고 이 아침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신기한가! 잠이라는 건 또 얼마나 신비로우며, 이 하루 동안에 또 무슨 일이 내 앞에 펼쳐질까?'라며, 눈뜰 때부터 감동하며 설레는 기대로써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세수하다 말고 문득 대야에 담긴 물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 이 물! 이 빛깔과 이 차가움과 이 질감(質感)! 이런 것이 여기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가?'라며 스스로 전율하는가 하면, 어제와 똑같은 출근길이 그렇게도 새롭고, 마치 처음인 듯 눈부시기까지 하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무회의 등에서 자신도 모르게 어느 새 당당하고 분명하게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는 자신을 문득 발견하기도 하며 ― 이전에는 끊임없이 다른 선생님들을 의식하며 그렇게도 주눅들고 자신없어 하던 그 시간이었는데 말입니다! ― 또 어느 날엔가부터는 그렇게도 버겁던 아이들이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럽게만 보여, '아니, 내가 이렇게도 학생들을 사랑했던가……?'라며 스스로 북받쳐 오르는 감동에 젖기도 한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살 맛'이 나겠어요? 얼마나 하루 하루가 재미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분이 그렇게나 벗어나고 싶어하던 '불안'과의 단 한 번의 진정한 맞닥뜨림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 한 번의 맞닥뜨림이 그렇게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되돌려 줍니다. 정말입니다, 욕득현전(欲得現前)이면 막존순역(莫存順逆)입니다.
5. 違順相爭 是爲心病 (위순상쟁 시위심병)
어긋남과 따름이 서로 다툼, 이것이 마음의 병이니
<달마어록(達磨語錄)>에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맡기지 않고 사물 ― 이때의 '사물'은 우리 안(內)의 사물을 가리킵니다. 곧 위에서 예로 든 불안이나 게으름, 외로움, 화(분노), 미움, 짜증 등등을 말입니다 ― 에 맡기기 때문에 취함과 버림이 없으며, 거스름과 순응함도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사물에 맡기지 않고 자신에게 맡기기 때문에 취함과 버림이 있으며, 거스름과 순응함이 있다. 만약 마음을 열고 사물에 맡길 수만 있다면 이것이 곧 이행(易行)이며, 그것에 저항하여 사물을 변화시키려 함이 곧 난행(難行)이다. 사물이 오면 오는 대로 그에 맡겨 거스르지 말며, 떠나가면 떠나가는 대로 내어버려 두어 좇지 말라. 이를 두고 도(道)를 행한다고 한다."
5. 違順相爭 是爲心病 (위순상쟁 시위심병)
어긋남과 따름이 서로 다툼, 이것이 마음의 병이니
<달마어록(達磨語錄)>에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맡기지 않고 사물 ― 이때의 '사물'은 우리 안(內)의 사물을 가리킵니다. 곧 위에서 예로 든 불안이나 게으름, 외로움, 화(분노), 미움, 짜증 등등을 말입니다 ― 에 맡기기 때문에 취함과 버림이 없으며, 거스름과 순응함도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사물에 맡기지 않고 자신에게 맡기기 때문에 취함과 버림이 있으며, 거스름과 순응함이 있다. 만약 마음을 열고 사물에 맡길 수만 있다면 이것이 곧 이행(易行)이며, 그것에 저항하여 사물을 변화시키려 함이 곧 난행(難行)이다. 사물이 오면 오는 대로 그에 맡겨 거스르지 말며, 떠나가면 떠나가는 대로 내어버려 두어 좇지 말라. 이를 두고 도(道)를 행한다고 한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6. 不識玄旨 徒勞念靜 (불식현지 도로염정)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하고 공연히 생각만 고요히 하려 하는구나.
이런 일은 비일비재(非一非再) 합니다.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진정한 평화란 불안과 하나가 되고 불안 그 자체가 될 때 넘치도록 우리에게 오는 것이건만,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을 못견뎌 하며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극복하고서야 이윽고 평화와 당당함을 맛보려 하지요.
6. 不識玄旨 徒勞念靜 (불식현지 도로염정)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하고 공연히 생각만 고요히 하려 하는구나.
이런 일은 비일비재(非一非再) 합니다.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진정한 평화란 불안과 하나가 되고 불안 그 자체가 될 때 넘치도록 우리에게 오는 것이건만,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을 못견뎌 하며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극복하고서야 이윽고 평화와 당당함을 맛보려 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고요란 격랑(激浪) 속에 있건만, 우리는 격랑과 소요(騷擾)를 버리고 고요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부족'을 채워서 충만하려 하거나, 번뇌(煩惱)를 버리고 보리(菩提)를 구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진리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7. 圓同太虛 無欠無餘 (원동태허 무흠무여)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거늘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대뜸 '도(道)'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도(道)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말하자면,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도(道)는 그렇게 추상적이지도 않고, 또한 따로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이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는 말일까요?
7. 圓同太虛 無欠無餘 (원동태허 무흠무여)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거늘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대뜸 '도(道)'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도(道)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말하자면,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도(道)는 그렇게 추상적이지도 않고, 또한 따로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이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안, 게으름, 외로움, 화(분노), 미움, 짜증 등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의 구체적인 우리들의 감정과 오욕칠정(五慾七情)이 그대로 무흠무여(無欠無餘)하다는 겁니다. 그 번뇌(煩惱)가 사실은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는 보리(菩提)라는 말이지요.
그러니 그냥 살면 돼요. 그냥, 간택(揀擇)하지 말고, 그러한 것들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순간순간 우리 안(內)을 흐르도록 내어버려 두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않지요.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고, 끊임없이 간택합니다. 보세요,
8. 良由取捨 所以不如 (양유취사 소이불여)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까닭에 여여(如如)하지 못하도다.
그래요, 단지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한 것은 취사(取捨)하는 이 분별심(分別心)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가) ―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 게으름, 불안 등 ― 를 버리고 (나) ― 미래의 바라는 자아상(自我像), 성실, 당당함 등 ― 로 향하는 그 마음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끊임없이 힘겹고, 한 톨의 진정한 평화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메마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9. 莫逐有緣 勿住空忍 (막축유연 물주공인)
세간의 인연도 따라가지 말고 출세간의 법에도 머물지 말라.
'세간의 인연'이란, 말하자면, 모든 것을 둘로 나누어 보는 상대적인 분별(分別)을 말합니다. 선(善)-악(惡), 미(美)-추(醜), 고(高)-하(下), 다(多)-과(寡), 부족-완전, 번뇌(煩惱)-보리(菩提), 중생(衆生)-부처 등등을 말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실재(實在)가 아니에요. 우리 사고(思考)와 관념이 만들어놓은 허구(虛構)라는 말이지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이 있지요? 모든 상대적인 분별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놓은 것일 뿐이라는…….
8. 良由取捨 所以不如 (양유취사 소이불여)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까닭에 여여(如如)하지 못하도다.
그래요, 단지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한 것은 취사(取捨)하는 이 분별심(分別心)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가) ―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 게으름, 불안 등 ― 를 버리고 (나) ― 미래의 바라는 자아상(自我像), 성실, 당당함 등 ― 로 향하는 그 마음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끊임없이 힘겹고, 한 톨의 진정한 평화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메마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9. 莫逐有緣 勿住空忍 (막축유연 물주공인)
세간의 인연도 따라가지 말고 출세간의 법에도 머물지 말라.
'세간의 인연'이란, 말하자면, 모든 것을 둘로 나누어 보는 상대적인 분별(分別)을 말합니다. 선(善)-악(惡), 미(美)-추(醜), 고(高)-하(下), 다(多)-과(寡), 부족-완전, 번뇌(煩惱)-보리(菩提), 중생(衆生)-부처 등등을 말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실재(實在)가 아니에요. 우리 사고(思考)와 관념이 만들어놓은 허구(虛構)라는 말이지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이 있지요? 모든 상대적인 분별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놓은 것일 뿐이라는…….
좋습니다,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원효(元曉) 대사의 예를 들어봅시다. 잘 아시겠지만, 원효는 나이 45세 때 의상(義湘)과 함께 당나라로 불법(佛法)을 구하러 갑니다. 가다가 도중에 해골바가지의 물을 마시고는 심외무법(心外無法, 마음 밖(外)에 따로 법[眞理] 없다)이라는 말을 남기고 신라로 되돌아오는데, 돌아와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에는 귀족적이고 단아(端雅)하던 그가 대중(大衆) 속으로 들어가 무애(無碍)박을 두드리며 "모든 것에 걸림없는 사람이 한 길로 생사(生死)를 벗어났도다."라는 구절로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음주와 가무와 잡담 중에 불법(佛法)을 전하는가 하면, 요석 공주와 동침해 설총(薛聰)을 낳기도 하고, 또한 2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종횡무진(縱橫無盡)의 무애행(無碍行)의 대자유를 느끼게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해골바가지 사건' 때 있었길래 그의 삶이 그토록이나 달라질까요?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불법(佛法)을 구하러 당나라로 가던 어느 날 칠흑같은 밤길을 걷고 있었는데, 비마저 추적추적 내려 어떻게든 쉬어갈 곳을 찾던 그에게 오래된 감실(龕室, 사당 안의 신주(神主)를 모셔두는 장(欌)) 같은 곳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 날을 걸어 피곤하고 지쳤던 터라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원효는 잠에 곯아떨어지게 되는데, 새벽녘에 몹시도 목이 말라 잠결에 더듬거리며 손에 잡히는 바가지의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어찌나 시원하던지! 그리곤 다시 잠이 드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자신은 사람의 뼈와 해골바가지가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무덤 속에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새벽녘 잠결에 마신 바가지의 물이 생각나 주위를 둘러보니, 오호라! 그것은 다름 아닌 해골바가지의 썩은 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원효는 견딜 수 없는 구토를 일으키며 데굴데굴 구르는데, 그러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心生故種種法生하고 心滅故龕墳不二라! 又三界唯心이요 萬法唯識이라. 心外無法하니 胡用別求리오! 我不入唐이라(마음이 일어나니 온갖 종류의 법(法)이 일어나고, 마음이 멸(滅)하니 감실(龕室)과 무덤이 둘 아니구나! 또한 삼계(三界)가 오직 마음이요 만법이 오직 식(識)이로다. 마음 밖(外)에 법 없으니 어찌 따로이 구하겠는가? 나는 당나라로 들어가지 않겠노라).
보세요, 원효가 새벽녘 잠결에 바가지의 물을 마실 때에는 분명히 그것이 깨끗한 물임을 확인하고 마신 것은 아니지만, 무의식중에 그것은 '깨끗한 물'이라는 분별(分別)이 내면 깊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자신이 마신 물이 해골바가지의 썩은 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 '더러움'에 견딜 수 없는 구토를 느끼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해골바가지의 물'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두고 보인 원효의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더럽다', '깨끗하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원효에게 있는 판단과 분별이지, 결코 해골바가지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골바가지는 그냥 해골바가지일 뿐인 것을 원효가 그것을 한 번은 '깨끗하다' 하고 다른 한 번은 '더럽다'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깨끗하다[淨]' '더럽다[垢]'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개념과 판단과 무게요 우리의 몫일 뿐 사물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 불구부정(不垢不淨) ―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른 얘기를 한 번 해보지요. 봄이 되면 온갖 꽃들이 피어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봄소식을 전해주는 눈부신 꽃이 있어요. 바로 목련꽃인데, 아! 화사하니 봄빛을 가득 받으며 활짝 피어나는 그 꽃을 보노라면 괜스레 마음이 밝아지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다음 순간 그 꽃이 지는 걸 보면 너무 추한 모습으로 허망하게 툭 떨어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아름답다[美]' '추하다[醜]'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목련꽃에는 없는 것이잖아요? 목련꽃은 그냥 피었다가 그냥 질 뿐인데,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다' 하고 또한 '추하다' 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미(美)'-'추(醜)'라는 것 또한 사물에 실재(實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분별(分別)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제가 서울에 도덕경 강의를 하러 올 땐 올라오는 차비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땐 서울 식구들이 주는 차비로 내려가는데, 한 번은 강의를 마치고 사람들과 헤어져 대구행 버스를 타려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해 보니, 어! 차비가 없지 뭡니까? 서로가 잊었던 거지요. 그래서 큰일났다 싶어 서울 식구 중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려고 생각하면서 호주머니를 뒤졌더니, 마침 '일반'고속버스 차비는 겨우 될 정도의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돈으로 차표를 끊고 버스에 몸을 실었는데, 손에는 200원이 남아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버스가 금강휴게소엘 들르기에 커피를 한 잔 마실 양으로 매점 커피코너에 가 "아가씨, 커피 한 잔 주세요……"라고 말하는데, 불현듯 내게 돈이 없다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었습니다. "아차! 아가씨, 미안합니다. 돈이 없네요."라며 얼른 취소하고는 그냥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도 동전 200원은 여전히 내 손안에 쥐어져 있었구요.
그런데 그때 그 200원이 참으로 많은 생각을 제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00원은 '많거나' '적은' 돈이 아니라 그냥 200원일 뿐이라는 거지요. 200원보다 더 많은 돈을 원하는 마음이 200원을 '적은' 돈으로 보이게 만들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하는 마음으로 보면 200원도 참 감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많다' '적다'라는 것은 200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200원은 그냥 200원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상대적인 분별(分別)과 비교는 사실은 사물 자체에 실재(實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무게입니다. 우리 마음이 모든 상대세계를 만들어내어 놓고서는 그것도 모른 채 이 세계가 실제로 그러하다고 믿는 착각 때문에 끊임없이 그 양편 모두에 끄달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승자박(自繩自縛)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한 마음 ― 이름하여, 분별심(分別心) ― 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사실은 이 상대세계가 곧 절대세계입니다.
'세간의 인연도 따라가지 말고(莫逐有緣)'라는 것은 바로 그 상대세계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이니, 그것이 실재(實在)하는 양 착각하여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눈 한 번 크게 뜨고, 우리 마음의 투영으로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사물로서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상대세계'라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승찬(僧璨) 스님이 '출세간의 법에도 머물지 말라(勿住空忍)'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요? 조금 전까지 제가 드린 말씀에 의하면, 모든 상대적인 분별은 다만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 허구요, 실재(實在)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相對)'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것인데, 그런데 진실로 그러한 줄을 알게 되면 여기에서 또 한 번의 절묘한 비약(飛躍)이 옵니다. '상대(相對)'가 없는 '절대(絶對)'가 아니라, 상대 그 자체가 곧 절대가 되는 비약인데, 이를 불가(佛家)에서는 '불이비일(不二非一)'이라고도 하지요. '둘'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도 아니라는 겁니다. 참 절묘하고도 정확한 말이에요. '상대'가 없다고 말하지만 또한 없는 것도 아니니, '없다'라는 것에 머물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물주공인(勿住空忍) 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분별심(分別心)을 내려놓게 되면, '분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되 거기에 매이거나 끄달리지 않게 됨을 말합니다.
10. 一種平懷 泯然自盡 (일종평회 민연자진)
한 가지를 바로 지니면, 사라져 저절로 다하리라.
그렇습니다. 한 가지를 바로 지니면……, 그런데 이 '하나'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이미 우리게 와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예로 들었던 그 선생님에게는 '불안'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구 모임의 모 교수님의 경우엔 '게으름'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경우의 '외로움'과 '화(분노)'와 '미움'과 '막막함' 등등의 온갖 번뇌(煩惱) ―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 ― 가 이미 우리에게 와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못견뎌 하며, 단 한 순간이라도 빨리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발을 동동 구르지요.
10. 一種平懷 泯然自盡 (일종평회 민연자진)
한 가지를 바로 지니면, 사라져 저절로 다하리라.
그렇습니다. 한 가지를 바로 지니면……, 그런데 이 '하나'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이미 우리게 와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예로 들었던 그 선생님에게는 '불안'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구 모임의 모 교수님의 경우엔 '게으름'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경우의 '외로움'과 '화(분노)'와 '미움'과 '막막함' 등등의 온갖 번뇌(煩惱) ―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 ― 가 이미 우리에게 와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못견뎌 하며, 단 한 순간이라도 빨리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발을 동동 구르지요.
아뇨, 단 한 순간만이라도 진정으로 거기 그냥 있어 보세요. 단 한 순간만이라도 진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단 한 가지라도 바로 지니게 되면, 모든 것이 사라져 저절로 다할 것입니다(一種平懷 泯然自盡).
11. 止動歸止 止更彌動 (지동귀지 지갱미동)
움직임을 그쳐 그침에로 돌아가면, 그침은 다시 더욱 큰 움직임이 되나니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치는 것[止]'이에요. 그친다는 것은 곧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참 못해요. 우리는 잠시도 가만있질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함으로써 '자기완성'을 이루려고 하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에서 (나)에로의 우리의 움직임[動]은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11. 止動歸止 止更彌動 (지동귀지 지갱미동)
움직임을 그쳐 그침에로 돌아가면, 그침은 다시 더욱 큰 움직임이 되나니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치는 것[止]'이에요. 그친다는 것은 곧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참 못해요. 우리는 잠시도 가만있질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함으로써 '자기완성'을 이루려고 하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에서 (나)에로의 우리의 움직임[動]은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움직임 ― '불안'을 극복하여 당당함에로 가려는, 부족을 채워 완전으로 가려는, 게으름을 고쳐 성실함에로 가려는,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가려는, 번뇌(煩惱)를 버리고 보리(菩提)로 가려는, 중생(衆生)을 버리고 부처로 가려는 ― 을 그쳐 그침[(가) 곧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에로 돌아가면, 진실로 그리하면, 그때 비로소 존재의 진정한 비약(飛躍)이 찾아와 마침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질서잡으려는 모든 노력이 정지할 때 그때 비로소 거대한 생명에너지에서 나오는 참 질서가 내 안을 강물처럼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그와 같이 '자유'란 미래의 어느 순간에 노력과 수행을 통하여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12. 唯滯兩邊 寧知一種 (유체양변 영지일종)
오직 양변에 머물러 있어서야 어찌 한 가지임을 알겠는가?
그렇지요. 우리가 늘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가)를 못견뎌 하면서도 온전히 (나)에로 가지도 못하는, 그래서 언제나 그 사이에서 마른 입술만 바짝바짝 태우고 있는……. 아아, 애틋하게 말씀하시는 승찬 스님의 말씀에 진실로 귀기울여 보세요!
13. 一種不通 兩處失功 (일종불통 양처실공)
한 가지에 통하지 못하면, 양쪽 다 공덕을 잃으리라.
14. 遣有沒有 從空背空 (견유몰유 종공배공)
있음을 버리면 있음에 빠지고, 공함을 따르면 공함을 등지게 되나니
이 또한 앞에서 얘기한 '막축유연 물주공인(莫逐有緣 勿住空忍)'이라는 말과 결부시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있음을 버리면 있음에 빠진다'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게으름'이나 '불안', '외로움' 등등을 버릴려고 하잖아요? 햐, 근데 이게 버릴 수 있거나 버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버릴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깊이 그 속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끊임없는 괴로움만 더할 뿐이지요.
12. 唯滯兩邊 寧知一種 (유체양변 영지일종)
오직 양변에 머물러 있어서야 어찌 한 가지임을 알겠는가?
그렇지요. 우리가 늘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가)를 못견뎌 하면서도 온전히 (나)에로 가지도 못하는, 그래서 언제나 그 사이에서 마른 입술만 바짝바짝 태우고 있는……. 아아, 애틋하게 말씀하시는 승찬 스님의 말씀에 진실로 귀기울여 보세요!
13. 一種不通 兩處失功 (일종불통 양처실공)
한 가지에 통하지 못하면, 양쪽 다 공덕을 잃으리라.
14. 遣有沒有 從空背空 (견유몰유 종공배공)
있음을 버리면 있음에 빠지고, 공함을 따르면 공함을 등지게 되나니
이 또한 앞에서 얘기한 '막축유연 물주공인(莫逐有緣 勿住空忍)'이라는 말과 결부시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있음을 버리면 있음에 빠진다'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게으름'이나 '불안', '외로움' 등등을 버릴려고 하잖아요? 햐, 근데 이게 버릴 수 있거나 버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버릴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깊이 그 속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끊임없는 괴로움만 더할 뿐이지요.
그런데 진실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벗어나려는 노력을 정지하고 그냥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크리슈나무르티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있는 것을 있다 하고 없는 것을 없다 하는 것, 바로 거기에 진리(眞理)가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있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진리에 도달하려고 하지요.
'공함을 따르면 공함을 등지게 된다'는 것은, 아까 말한 물주공인(勿住空忍)과 결부시켜, '상대(相對)' 너머의 '절대(絶對)'를 구하다 보면 오히려 진정한 절대(絶對)를 놓치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구요, 같은 말이겠지만, 현재의 부족을 버리고 미래의 완전을 구하다 보면 오히려 진정한 완전 ―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 을 등지게 된다는 말로도 이해해도 좋습니다. 참 아이러니예요, 그죠?
15. 多言多慮 轉不相應(다언다려 전불상응)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 더 상응치 못함이요,
16. 絶言絶慮 無處不通(절언절려 무처불통)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곳이 없게 된다.
그래요, 오늘은 이것으로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네요. 보다 더 재미있고 좋은 예들이 강의 중에 언뜻언뜻 생각났습니다만,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지니까 그때 더 많이 더 풍성히 말씀을 나누기로 하구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계속)
'공함을 따르면 공함을 등지게 된다'는 것은, 아까 말한 물주공인(勿住空忍)과 결부시켜, '상대(相對)' 너머의 '절대(絶對)'를 구하다 보면 오히려 진정한 절대(絶對)를 놓치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구요, 같은 말이겠지만, 현재의 부족을 버리고 미래의 완전을 구하다 보면 오히려 진정한 완전 ―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 을 등지게 된다는 말로도 이해해도 좋습니다. 참 아이러니예요, 그죠?
15. 多言多慮 轉不相應(다언다려 전불상응)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 더 상응치 못함이요,
16. 絶言絶慮 無處不通(절언절려 무처불통)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곳이 없게 된다.
그래요, 오늘은 이것으로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네요. 보다 더 재미있고 좋은 예들이 강의 중에 언뜻언뜻 생각났습니다만,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지니까 그때 더 많이 더 풍성히 말씀을 나누기로 하구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계속)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