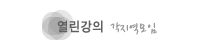밀물 드는 가을 저녁 무렵 / 고운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리랑 (222.♡.195.158) 댓글 0건 조회 6,130회 작성일 06-10-25 10:50본문
먼 바다 쪽에서 기러기가 날아오고
열 몇 마리씩 떼를 지어 산 마을로 들어가는
밀물 드는 가을 저녁 무렵
사립문 밖에 나와 산과 구름이 겹한
새 날아가는 쪽 하늘 바라보다
밀물 드는 모랫벌 우리가 열심히 쌓아두었던
담과 집과 알 수 없는 나라 모양의
탑쪽가리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
낮의 햇볕 아래 대역사를 벌이던 조무래기들
다 즈이 집들 찾아들어가 매운 솔가지 불을 피우고
밥 짓고 국 나르고 밤이 오면 잠들어야 하는
밀물 드는 가을 저녁 무렵
분주히 하루를 정리하고들 있었다
그러면 물은 먼 바다에서 출발하여
이 마을의 집 앞까지 밀려와 모래담과
집과 알 수 없는 나라 모양의
탑쪽가리 같은 것부터 잠재웠다
열심히 쌓던 모든 것을 놓아두고
각자의 집으로 찾아들어간 조무래기들의 무심함만큼이나
물은 사납거나 거세지 않게
천천히 고스란히 잠재우고 있었다
먼 바다 쪽에서 기러기가 날아와
산마을 어디로 사라지는
밀물 드는 가을 저녁 무렵
이 도시에 밀물처럼 몰려오는 어둠
먼 시가지 보이는 언덕길 버스 종점에 내려
돌아올 버스 토큰 하나 남았던 허전함처럼
모두 쓰고 버리고 힘들여 쌓아놓고 오는 밤
불을 키우고 어둠을 밝혀
한낮의 분주함도 이으려지만
먼 옛마을에 찾아와 호릉불 몇 개로 정체를 밝히던 어둠이여
오늘 인공의 빛을 피해 찾아오는 밀물이여
이미 어린아이 적처럼
만들었던 것들과 무심히 결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깊은 잠을 주고 또 평평히
세상의 물상들 내려앉히는
대지의 호흡이여
어느땐가 밤이 깊어져
물은 떠나온 제 땅으로 돌아가고
백지처럼 정돈된 모랫벌에 아침이 오면
이루었으나 아무것 이룬 것 없는 흔적 위에
조무래기들 다시 모여들었더니
물이 들어왔다 나간 이 도시의 고요함을 딛고
내가 간다
살아왔던 일일랑 잊을 만하고
새 벌판은 끝이 없어
또 쌓아야 모습은 못날 뿐이지만
일이 끝나 날이 저물면
가슴에 벅차도록 몰려오는 밀물은
산이 되고 밭이 되고
집과 자동차와 친구가 되고
정승이 되고 나라가 되고
희망도
사랑도 되었을 것을
< 8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