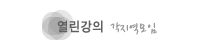감사합니다, 선생님
페이지 정보
작성자 - 댓글 1건 조회 6,567회 작성일 11-01-18 21:48본문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저 오늘 정말 실컷 울었습니다. 눈물이 펑펑 나기보다는 차라리 목에서부터 꺽꺽거리는 소리가 올라오도록,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저 혼자 많이 이야기하고, 저를 많이 쳐다보고, 많이 만져보면서,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선생님,
엄마에 대한 제 마음을,
증오라고 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심이라고 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사한 것이 아니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냥 너무 오래 참았던 눈물이고 울부짖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다고……, 정말로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면서,
정말로 너무너무 오랜만이라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랜만에, 소리 내어 울면서, 저와 정말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 기억 속 엄마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소리 내어 말하고, 소리 내어 울고, 나는 정말 아파서 그랬다고 소리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원해왔던 일인지, 오늘 새삼 깨달았습니다.
몰랐는데요, 오늘 새로운 걸 자각했답니다. 초등학교 때 일기장을 보다가, 중학교 때 적었던 소원 리스트를 보다가, 똑같은 걸 발견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썼더군요. "엄마에게 안겨 울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다. 그러고 싶을 때마다, 늘 상상한다. 우는 나를 안아준 엄마의 얼굴(내가 볼 수 없는 얼굴)이 너무나도 슬픈 모습을." ……와, 전 그때 겨우 6학년이었는데,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엄마의 짐이라느니, 족쇄라느니, 엄마를 보내줘야 한다느니, 별 얘기를 다 써놨더군요. 중학교 때 소원 리스트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안겨서 울어 보기." 이렇게 오랫동안 저는 엄마에게 위로 받기를 원했고, 마음 놓고 울기를 원했고, 심지어 일기에 연습장에 적어 놓기까지 했는데, 왜 이제서야 알게 된 걸까요. 저 스스로 저에게 걸어놓은 어떤 금제가 풀린 느낌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정말 많은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물론 집에는 동생밖에 없었지만요ㅎㅎ.
나는 엄마 딸인데, 나는 엄마 딸이었는데, 작은 아이였는데, 왜 그 아이가 엄마에게 버림받을까봐, 또 가라고 할까봐, 움츠리고 눈치보게 만들었냐고,
왜 나와 동생은 엄마의 짐이다, 우리가 엄마를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족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학하게 만들었냐고,
나도 정말 아파서 그랬던 거라고,
나도 아빠의 폭력이 무서워서, 겁나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랬던 거라고,
엄마를 상처 입히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고,
나 정말 착한 딸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엄마에게 사과 같은 걸 바란 게 아니었다고,
그냥 아프냐고, 아팠냐고, 많이 무서웠냐고, 물어주었다면
내가 너무너무 아팠다고 하면, 정말 무서웠다고 하면, 그냥 한 번 안아주고, 한 번 소리내어 울게 해주고, 괜찮다고, 엄마도 아팠다고, 우리 인이도 아팠냐고…… 그렇게 말해주었으면, 내 등을 한 번 쓰다듬어 주었으면,
나는 아주아주 오래 전부터
정말로 괜찮아졌을 거라고,
왜 그렇게 해주지 않았냐고,
나는 그냥 엄마에게 사랑 받고 싶던, 위로 받고 싶던, 겁에 질려 떨고 있던,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래도 엄마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엄마의, 당신의 작은 아이였다고, 당신의 품에서 울고 싶던 작은 새였다고, 그뿐이었다고……. 나는 아주 오래 전부터, 분명 그걸로 족했을 거라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말해보았습니다.
정말로 펑펑 우는데, 울다가 울다가 구역질이 날 정도로 우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앞에, 아주 오래 전의 어린 제가 서있는 것 같은 착각이 일었습니다. 엄마의 과도를 보고, 나가라는 말을 듣고, 애들도 다 필요 없다는 말을 듣고, 엄마가 맞는데 불구경 하듯 보기만 한다는 비난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고 가냘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파 보였습니다.
그 아이를 '증오'라고 부르고 있었나봅니다.
그 아이를 '족쇄'라고 불렀나봅니다.
그 아이의 눈물을 '배반'이라고 불렀나봅니다.
억지로 웃는 모습만, '배려'라고 칭찬했나봅니다.
괜찮다고, 난 아무렇지도 않다고 꾸며대는 모습만, '착하다'고 쓰다듬었나봅니다.
정작 제가 안아주야 했던 건, 형편없이 망가진 얼굴로 어쩔 줄 모르고 서있는 그 아이였는데요. 웃기지도 않게 어른인 척 하며, 아무렇지도 않았어, 거짓말하던 그 모습만 칭찬할 게 아니라, 아직까지 거기 서 있는 그 아이를 칭찬했어야 했는데요.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와주었다고, 안아줬어야 했는데요. 어른인 엄마도 그렇게 무서웠는데, 아이인 너는 얼마나 무서웠느냐고, 도닥여줬어야 했는데요.
더 이상 그 아이를 증오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고 싶을 때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이렇게 평화로운데 대체 왜 어리광부리느냐고 저를 다그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엄마조차 안아주지 않았던 그 아이를, 왜 저마저 외면하려고 했던 걸까요.
많이 외로웠겠죠, 분명히.
오늘 밤에는, 그 아이의 야윈 등을 한 번 쓰다듬으러 가야겠습니다.
제가 밀어내려고 했던 저를,
그 약한 아이를,
괜찮다고 위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조차 비난했던 저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다고, 정말 괜찮다고 하셨을 때, 많이 슬프고, 또 많이 기뻤습니다.
댓글목록
김기태님의 댓글
김기태 작성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이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의 야윈 등을 쓰다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참 많이 울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