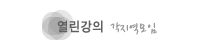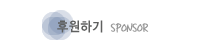참 좋은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태 댓글 0건 조회 7,238회 작성일 08-10-27 15:58본문
분별을 하게 되나 거기 매이거나 끄달리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재현 08-10-23 13:43
선생님, 안녕하세요. 감사한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신심명 다시읽기를 보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분별심을 내려놓게 되면 '분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분별'하되 거기에 매이거나 끄달리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별을 하면 분별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고 옳다/그르다 로 분별한 사항에 대해서 내가 옳다 라고 분별한 부분으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애초에 분별심을 내려놓기 이전과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매이거나 끄달리지 않는다는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어차피 분별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강경 제17분(分)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一切法이 皆是佛法이니라 / 일체법이 모두 불법(佛法)이니라.”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일체 유위법(有爲法)이 곧 무위법(無爲法)이요, 분별이 곧 불법(佛法)이라는 말입니다. 즉, '분별심'을 내려놓고 깨달아 보면 매 순간의 분별이 곧 깨달음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전(悟前)'과 '오후(悟後)'가 아무런 차이가 없고, 또 그런 의미에서 ‘깨달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요. 그런데도 범부(凡夫)와 부처 사이에는 또한 너무나도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 그렇다면 그 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흔히들 ‘분별심을 내려놓는다.’라고 말하면 그야말로 아무런 분별도 하지 않는, 분별 자체가 사라진, 그래서 마치 목석(木石)과도 같은 존재가 되는 것쯤으로 (더구나 그것을 무슨 대단한 경지라도 되는 것쯤으로) 곧장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뇨, 그것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죽은 것이며, 혹은 어떤 강한 정체된 에너지 상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깨달음은 그런 것이 아니며, ‘어떤 상태’ 속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순간 가.장.역.동.적.인.있.는.그.대.로.의.생.명.자.체.가.되.는.것.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자 도덕경 42장에 보면 ‘만물부음이포양(萬物負陰而抱陽)’이라고 하여, ‘만물은 그 각각이 음(陰)을 등에 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양(陽)을 가슴에 껴안고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듯이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은 음(陰)적인 것과 양(陽)적인 것들을 자기 안에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으며,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꽃 필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고, 강함이 있으면 약함이 있으며, 물기 촉촉할 때가 있으면 마른 먼지 푸석 일어날 만큼 메마를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와 같이, 모든 것은 음적인 것과 양적인 것이 서로 번갈아 조화를 이루며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바로 ‘생명’의 속성인 것이지요.
그 있는 그대로의 생명성 자체가 되는 것, 그리하여 그 어느 것도 간택(揀擇)하거나 취사(取捨)하지 않고 ‘흐름’과 하나가 되고 ‘흐름’ 자체가 되는 것, 그것을 일컬어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다음과 같이 말하지요.
“삼라만상 실개성불(森羅萬象 悉皆成佛)”
“삼라만상은 모두 성불(成佛)해 있더라!”
그 ‘흐름’을 우리 내면으로 돌렸을 때, 우리 안에도 끊임없는 흐름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즉, 기분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우울할 때가 있으면 경쾌할 때가 있고, 말을 더듬으며 긴장하고 경직될 때가 있으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미움이 올라올 때가 있으면 사랑에 겨울 때가 있고, 그와 같이 분노와 자비심, 잡생각과 고요, 불안과 당당함, 간교함과 정직, 성실과 게으름, 초라함과 대범함, 심심함과 재미, 무기력과 힘(Power) 등등 온갖 빛깔과 모양을 가진 생각과 감정과 느낌들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음을 봅니다.
그 ‘흐름’과 하나가 되고 그 ‘흐름’ 자체가 되어 다만 매 순간 있는 그대로 흐르고 존재할 뿐일 때 우리는 그를 ‘부처’라 하고 '자유'라 하며, 그 하나하나를 <분별>하여 자신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취(取)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버리려 할 때 우리는 그를 ‘중생’이라 하고 '구속'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흐름’ 자체는 중생이나 부처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중생이 곧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분별하고 간택하고 취사하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생(生)-사(死)가 갈리고, 중생과 부처가 나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분별-간택하는 마음이 내려져서 있는 그대로 흐르고 존재하게 되었을 때, 이를 달리 ‘대긍정(大肯定)에 들어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고 난 후에도 여전히 분별하고 간택하며 살아가게 되지만 ― 왜냐하면, 분별하고 간택하는 것이 ‘생명’의 속성이니까요 ― 그것 자체가 ‘대긍정’ 안에서의 분별과 간택이기 때문에 거기 어디에도 매이거나 끄달리지 않게 되는 반면에, ‘흐름’ 자체가 되지 못하고 긍정의 대상과 부정의 대상을 <분별>하여 흐름을 막아가면서까지 간택하고 취사하게 된다면 그 하나하나마다에 매이고 끄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똑같은 <분별>이라 하더라도 '오전(悟前)'의 분별은 이원성(二元性) 속에서의 취사간택이어서 그 하나하나마다에 ‘무게’가 실리고 결국엔 모든 것이 힘들어지게 되지만, '오후(悟後)'의 분별과 간택은 그 자체가 일원성(一元性) 속에서의 생명의 자연스런 발현들일 뿐이기에 그 모든 분별에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는지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